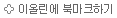2008 10 Best Albums
1. The Roots - Rising Down
골상학을 정점으로 더 루츠의 대중적인 인기는 사그러들기 시작했지만, 퀘스토가 추구하는사운드는 점점 딥해져 왔고, 그에 따라 앨범 안에 담기는 내용 또한 풍부하고 윤택해져 왔다. 그러나 역시 점점 우울해지는 앨범 전체의 분위기는 기존 루츠팬들에게도 새 앨범을 접하는데에 어느정도의 장벽이 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런 평가속에 발매된 본작에서 들을 수 있는 루츠의 음악은 언제나 그렇듯 충격적으로 새롭지만 노선은 벗어나지 않은 전형적인 루츠의 방향성을 담고 있었다. 변함없이 – 또, 아이러니하게도 - 퀘스토는 팝의 문법을 사랑하며 대중과의 소통을 갈망하고 있었고, 한편으로는 자신이 앨범을 통해 가져가고 싶은 부분은 확실히 지켜내는 묘한 밸런스감 역시 지켜내고 있었다. 그야말로 고통스럽고 시원한 자기파괴와 창조의 연속. 두말할 필요 없는 2008년 최고의 명반이었다. 루츠의 앨범은 매년 나와도 매년 죽여줄 수 밖에 없다. 음악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만드는 사람의 인간성이 존나 죽여주니까.
2. Siji - Ade Siji
2008년 최대의 발견. 수작이었지만 그래도 크게 범작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던 전작에 비해, 거의 다른사람이 만든 앨범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변신을 해서 나타난 나이지리아 출신의 이 싱어송 라이터는, 자신의 음악 장르를 스스로 규정하는 데에도 애를 먹을 만큼 광범위한 음악적 스펙트럼을 그 안에 지니고 있었다. 상상 가능한 거의 모든 흑인음악의 텍스트를 아프리카의 그루브 위에 우월하게 버무린 본작은 그야말로 올 한해 음악씬에 내린 가장 큰 축복 중 하나였던듯. 낯을 상당히 가리는 편인 내가 인터뷰 하러갔다가 두시간을 내리 노작거리게 될 정도로 사람도 좋다. 원래 사람이 좋으면 음악도 좋은 법이다(뻥).
3. Erykah Badu - New Amerikayah Pt. One
소울쿼드리안 시대 이후의 에리카 바두는 어딘지 기운이 없는 모습이었다. 앨범 발매도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고, 스캔들에도 휩싸였다. 에리카 바두라는 이름은 여전히 높은 기대감을 동반했지만 - 아마도 동시대 보컬중에 에리카 바두 정도의 기대감을 가져오는 이름은 디안젤로 정도 뿐이리라 - 동시에 개인적으로는 그 이름에 조금씩 지쳐 멀어져가고 있었다. 그러나 5년만에 돌아온 본작은 에리카 바두라는 그 이름을 세상에 완전히 새롭게 각인시키며, 그 이름에 으례 동반되는 높은 기대감 또한 완벽하게 충족시켰다. 소울쿼드리안과 함께 했던 전작들에서의 딥하고 소박하게 사람 죽이는 맛은 많이 사라졌지만, 그에 못지 않은 다양함, 소울에 대한 천재적일정도로 기발하고 새로운 해석들로 가득찬, 맛깔나는 음악적 보케뷸러리가 거기 있었다. 소울의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해 마치는 이상적인 찬미.
4. Portishead - Third
포티쉐드라는 이름은 나로 하여금 선생님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한다. 더미는 당시 음악씬이 다 소화하기도 힘들었을 만큼 무거운 앨범이었다. 우리에게 맡겨진 숙제는 한보따리였고, 그걸 풀어내다보니 트립합이라는 것도 어디서 툭 튀어나왔고, 그러다 다시 정신을 차려보니 미칠듯한 숙제를 무책임하게 던져놓은 선생들은 어디로 사라진지 오래였다. 그러기를 십수년. 포티쉐드는 마치 숙제검사를 하듯 우리를 다시 찾아왔다. 또 다른 알 수 없는 숙제의 보따리를 짊어진 채. Third는 딱 그런 앨범이었다. 알 수 없는 실험들로 가득 차 있었으며, 그 너머의 세계는 여전히 보일듯 말듯 어슴푸레한 실루엣만을 우리들의 귓가에 비치고 있었다. 아마도 우리가 이 숙제를 또 다 풀 때쯤, 그래서 새로운 세계의 공기를 맛볼 수 있을 때 쯤, 이 앨범은 과거를 돌아 볼 수 있게 하는 기점이 되어 줄 것이다. 아, 우리의 원점이 여기 또 하나 있었구나, 하고.
5. Foreign Exchange - Leave it all behind
소포모어 징크스라는 저주는 다른 장르에서도 많이 발견되지만, 두번째 앨범을 말아먹거나 아예 발매조차 못하고 눈부신 1집만을 내놓고 사라지는 뮤지션들은, 방법론이나 연주실력보다는 샘플링 작법이 주가 되는 이 바닥에선 유독 심하게 널려있는 편이다. 하지만 전작 또한 수작이라는 평가를 들으며 많은 사랑을 받았던 FE는 전작과는 격을 달리하는 우월함을 담은 앨범을 만들어 내며 올해 음악씬을 풍요롭게 해주었다. 이들의 음악은 분명 소울의 형식과 방법을 취하고 있지만 담고 있는 정서는 소울의 중력에서 벗어난 완전히 새로운 무엇이었고, 그렇게 만들어진 본작은 이 경지의 어려움을 알고 있다면 감탄을 금치 못할 네오 소울의 또다른 가능성을 보여준 명반이었다.
6. Flying Lotus - Los Angeles
이토록 놀라울 수 있을까. 음습하게 깔리는 노이스 위로 쏟아지는 사이키텔릭한 소울사운드. 예고된 개명반 Los Angeles는 그렇게 찾아왔다. 피는 못속이는 듯 앨범은 자유로운 사운드의 실험과 운용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로 감겨드는 그루브와 뇌리에 강한 인상을 남기는 신디사이저와 보컬의 운용에서 높은 완성도로의 열의또한 느껴졌다. 아프리칸, 소울, 훵크 및 사이키델릭의 가장 현대적인 복합체. 비오는 날 칼국수 대신 날으는 벚꽃.
7. Stereoscope Jerk Explosion - La Panthere Pop
프랑스에서 날아온 이 강력한 훵크머신의 음악을 처음 접하고는 이 밴드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봤지만, 공식 홈페이지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 - 프랑스 훵크씬에서는 내공이 좀 있는 멤버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 - 이외에는 알아낼 수가 없었다. 후랑스어는 어렵거등...
SJE의 음악은 그야말로 내공이 절절 끓어 넘친다. 앨범 전체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 훵크 문법들의 전형성은 그 사용의 편리함의 이면에 음악에 대한 어지간한 이해와 내공이 있지 않으면 앨범을 창작 축에도 못끼는 쓰레기로 전락시킬수 있는 위험을 지니고 있지만, SFE는 이 문법들을 능숙하게 사용해 무엇보다 단단한 앨범의 베이스를 구성해 놓았다. 그리고 그 위로 쏟아지는 프랑스의 정서가 물씬 풍기는 아름다운 멜로디와 하드한 그루브는, 자신이 걸어온 길을 꼼꼼히 되짚어 가며 앞으로 한발자국씩 나아가는 용기있는 장인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죽도록 훵키하고 싶으면 들으면 되는 물건.
8. Eric Lau - New Territories
현재 전 세계 독립음악씬의 헤게모니는 어디가 가지고 있느냐고 묻는다면, 대답은 단연코 영국, 런던씬이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예전에도 대륙 단위로 뿌려대던 막강한 영향력이 어디 갔다가 지금 돌아온 건 아니지만, 요즘 런던에서 뻗어나오는 음악들은 유달리 심상찮게 좋고 무게가 실리는 느낌이다. 올해 발매된 에릭 라우의 데뷔작 또한 그런 심상찮은 앨범 중 하나였다. 영국 사람들 특유의 똘끼가 양껏 가미된 - 중국계 영국인이긴 하지만 - 알앤비의 유전자를
가진 이 댄스 앨범은, 단순히 그루브나 독특한 송라이팅뿐만 아니라 거칠고 투박한 사운드 메이킹이 그 매력을 더해 묘한 중독성을 준다. 거의 흠잡을 데 없는 이상적인 음반.
9. James Pants - Welcome
“이 인간 음악이 촌스러운건지 존나게 새로운건지 전혀 모르겠어!”라던 PBW의 첫인상을 청자들에게도 그대로 안겨주고 싶었던 모양인지, 스톤 스로우의 새로운 기대주 제임스 팬츠의 데뷔 앨범은 그런 모양을 하고 있었다. 쿨 하고 미니멈한 댄스넘버들로 채워진 웰컴은 다프트 펑크의 중력에 묶여 그 근처에도 가지 못한 채 달달하고 뭐 없는 비트만 쏟아내는 타 뮤지션들에게 일침을 놓으며 강한 인상을 남겼다. 그 어떤 무엇보다 댄서블 하지만 가볍지 않고, 묵직하게 무게중심도 실려 있지만 너무 로우하지도 않은 절묘한 밸런스가 돋보이는 앨범. 사이키델릭 락의 콜렉터이기도 한 제임스 팬츠의 취향을 반영하듯 시종일관 연기처럼 나타났다 사라지는 전자음들 또한 매력적이다.
10. Rapheal Saadiq
원래 뭐 한다고 큰소리 뻥뻥 치는 놈은 별 볼일 없지만, 큰소리 쳐놓고 진짜 하는 놈은 무서운 법이다. 다음 앨범은 옛날 알앤비를 할꺼에요 라던 라파엘 사딕은, 천재라는 세간의 평가에 대해 그정도 단어로 자기를 묘사하는 건 기분나쁘다고 말하는 듯한 앨범으로 돌아왔다. 들어보면 대략 모타운 같으면서도, 또 잘 뜯어보면 60년대에는 있지도 않았던 스타일이나 음악적 문법들이 착실하게 반영되어 있다. 2분 남짓으로 트랙의 길이를 짧게 한 부분까지 멋스러운 앨범. 이거 2000년 한복판에 이런거 떨궈놓으면 비교할 대상도 없고 그냥 마냥 좋고 미치는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