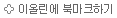영화 도쿄 소나타에 대한 미리니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쿠로사와 키요시(올바른 외래어 표기법으로는 구로사와 기요시)감독의 영화를 내가 본 적이 있었던가. 내용이 거의 기억에 안남을 정도로 무서웠던 영화가 하나 기억났다. [도플갱어]인가 싶었는데 [회로]였다. 응. 나 공포영화 덜덜 떨면서 보는거 좋아하지만, 공포영화라는게 으례 그렇듯 정말 잘 만들어진 작품은 찾기 힘들고, 회로는 그 중에서 그 독특함 뿐만 아니라 월등한 완성도로 내 기억속에 남아있는 영화였다.
도쿄소나타는, 쿠로사와 키요시가 공포영화감독이라는 배경지식에서 기인한 바가 큰 결론이긴 하지만, 공포영화이다. 하지만 이 영화, 삐뚤어질 대로 삐뚤어진 공포영화이다. 무릇 공포란 명줄을 뒤고 뒤흔드는 데서 오는 손발의 오그라듬을 지칭하는 것이 순리이거늘, 이 속이 배배꼬인 영화는 '가족'을 물고 늘어진다. 그것도 그냥 가족이 아니다. '보통'가족이다. 2009년 현재 일본(과 많이 닮은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에서 흔하게 찾아 볼 수 있는, 경제적 위기라는 거대한 벽 앞에 균열을 드러내는 가족. 인물들은 그 가족을 어떻게든 지켜내지만 이미 벌어지기 시작한 균열은 제이슨의 도끼날처럼 빈틈을 노리고 어김없이 날아든다. 이 영화의 공포는 그렇게 '가족'을 담보로, 손발이 오그라들 정도로 어색한 분위기를 타고 스크린을 지배한다.
분명히 내가 아는 '가족', 중고등학교 도덕시간에 배웠던 '가족(김모작가님은 찢어서 앞뒤를 바꿔붙이면 족가->족까 라고 해석하셨던)' 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다. 거기에는 좀 더 탄탄한 유대감과 세상의 기본을 이루는 빛나는 공동체 의식이 있게 마련인데, 이 가족은 그렇지 않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 가족에 위화감을 느끼지도 않는다. 아, 그렇구나, 한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남들도 이루는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는 현실의 관성에 올라타 남편이라는, 아내라는, 자식이라는 페르소나를 억지로 만들어내고, 그렇게 억지로 만든 현실도 채 받아들이지 못해 상처입히고 허덕댄다. 영화는 많은 시간(실제로 러닝타임의 대부분)을 할애해서 이 찌질함을 끈기있게 쫓아간다. 종반까지 산발적으로 이어지는 에피소드들은 어찌보면 이 거짓 자아의 찌질함에 대해서 실감나게 묘사하기 위한 시퀀스들의 모음이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것이다(물론 크게 틀린다는 개념은 존재할 수 없지만).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신이 지켜야 할, 지켜야 한다고 생각해 왔던 현실 앞에서 한껏 도망친 후에야("아냐! 이건 아냐!") 현실의 관성속에서 잃었던 자신의 할 일을 어렴풋하게나마 찾아낸다. 그 과정에서 잃어버린 것은 자신을 돌아보지 않은 죗값이다. 아이는 적게 살아 죄가 적은 것일까. 그것이 어쩌면 영화의 마지막을 가장 간지나게 장식하는 <월광>의 장면이 켄지에게 선사된 이유일지도 모르겠다.